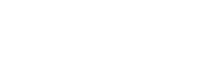어느 아저씨의 넋두리
강남덕(02)
작성일
08-07-16 15:14 11,083회
1건
본문
............통한의 세월이여, 비련의 현실이여.
조상이 올챙이였는지 나이를 배로 먹기 시작했다.
역삼각형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일자형 몸매라도 감지덕지하련만 유선형이 웬 말이더냐.
조선시대 한 여성이 규중칠우를 쟁론하며 골무 등 바느질 도구와 친구하였다면
21세기 중년남성 대부분은 몇 년 전에 샀던 바지와 와이셔츠를 바라보며 그저 한숨만 쉴 뿐이다.
모질게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모질게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알코올이 복부비만의 원흉이라니 술을 끊겠다고 독한 다짐을 한 적도 있었다.
주말이면 산에도 다녔고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뛰기도 했다.
밥공기가 반으로 줄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밤 9시 이후 모든 음식물은 위장 내 반입금지라는 엄포에 "짹"소리도 하지 않았다.
매일 야근에, 어쩔 수 없는 술자리에 다이어트 할 팔자도 못 된다고 한탄했지만
의지박약에 핑계꾼이라는 마나님 잔소리가 두려워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공허감이 파도처럼 밀려든 일요일 밤,
그러다 어느 날, 공허감이 파도처럼 밀려든 일요일 밤,
냉장고를 열어봐야 쥐포 한 마리 안 보이고,
'뭐 좀 만들어주지'라는 말에 오이, 당근, 브로콜리를 한 접시 받은 그때. 토끼처럼 모이를 갉아먹다가 울컥 들어버린 생각.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는 뜻이 아니라 승리를 원한다는 말이다.
양재동 사는 호랑이띠 원국씨도 그랬다.
자기는 밖에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가서 집 밥을 먹어야 한다고.
집 밥이 주는 온기와 소속감을 자기 전에 확인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진상 남편 때문에 고달프지만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있느냐며 원국씨 부인은 밥을 차렸다.
그 말을 하는 원국씨는 의기양양했고 그 말을 듣는 후배는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음식이라는 것은 단지 위장을 채우는 용도만은 아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단지 위장을 채우는 용도만은 아니다.
공복감은 위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가끔씩 휴일 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라며 집사람을 달달 볶는 남자도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귀신이 들러붙어서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그 황송한 대접에 굶주려 있을 뿐이다.
밖에서는 위아래 눈치를 보며 살다가,
밖에서는 위아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집에 와서도 모든 식단은 아이들 위주로 짜지고,
나만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던 아내의 도마질이 그리워질 때 남편은 진짜 배가 고파진다.
그 시간이 밤 열한 시든, 열두 시든, 메뉴가 김치말이 국수든 배춧국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남편 몸 생각하는 아내의 배려는 고맙지만
이전에 어머니가 그러했듯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 조건 없이 가져다 주던 그 집중 받음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 진짜 구차해진다.
밥 안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 것 같다.
진짠데.
(조선일보 2008년 7월 16일자 윤용인의 '아저氏 가라사대'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