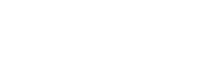김부조 시집 / 그리운 것은 아름답다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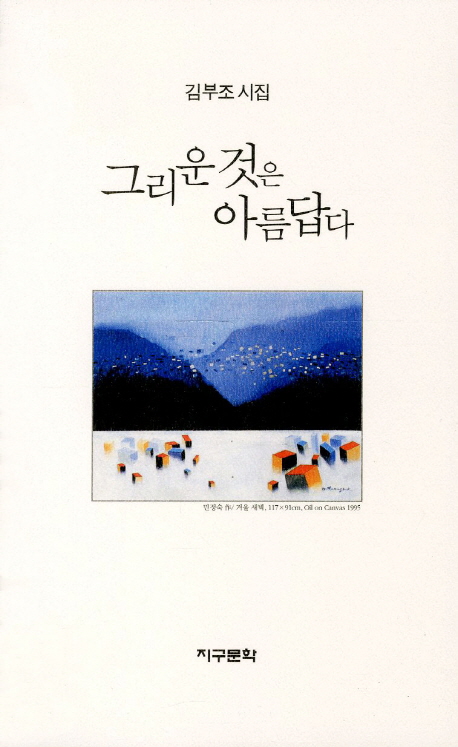

시인은 오랜 세월,
각박한 삶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류의 희로애락을
침묵으로 다독인 채
녹이고만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삶의 결정체를 향한
예고 없는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시집에 수록된 60편의 시(詩) 속에
절절히 녹아 있는 시어(詩語)들은
각박한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다가설 것이다.
* 작가약력
1957년 부산에서 출생, 울산에서 성장했다.
1981년 전국대학생문예 소설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문인의 꿈을 키워 가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 중등교과서, EBS 교육방송교재,
세계대백과사전 편찬 등에 기여하며
출판, 편집의 외길을 걷고 있다.
2009년 <지구문학> 시 부문 신인상으로
문단에 발을 들여 놓은 뒤
2010년에는 <한국산문> 수필 신인상으로
산문작가로서의 길에도 발걸음을 보탰다.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지구문학작가회의 이사
● 한국산문작가협회 회원
● 울산 경상일보 칼럼 <태홧강> 집필 중
● 현재 동서문화사 편집부 근무
<시인의 말>
- 그리운 곳으로 떠나며 -
그리운 것은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아득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운 ‘글쓰기’도
역시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녹이고만 살았다.
각박한 삶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류의 희로애락을
침묵으로만 다독이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결정체를 향한 리허설이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담장 아래에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뗀다.
쓸수록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러나,
기꺼이 선택한 길이므로
담담하게 나아가리라.
서툰 글 껴안아 주신
함홍근 은사님과
출간이 되기까지
여러모로 애써 주신
지구문학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봄날에
김부조
<발문 중에서>
김부조의 시는 시편마다
변증법적 사유의 가능성을
깊이 안고 있다.
마치 삶의 네비게이션을 탑재한
원고지처럼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찾아 나설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만능적 종합적 수퍼 컴퓨터의 기능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고 있으나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수년 전까지,
쉽게 접하던 힘들고 한 서린 작품에서는
단어 하나, 행간 등
조심하려는 흔적이 많았었다.
연과 연, 망치와 징의 다듬는 소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요즘의 시는 대담하고 줄기차다.
힘이 넘친다.
간혹 매끄럽지 못한 낯선 용어가
옥수수알처럼 섞여는 있으나,
산뜻하다.
반면 단조롭다.
지나치리만치
겁 없이 뛰어다니는 시인이다.
방안을 서성이다가
마루를 건너뛰고,
울타리를 넘기도 한다.
좁은 일터를 기웃거리다가
지하철을, 시장을,
도로를 달리기도 한다.
시집 목차
<1부>
침묵
독백獨白
각인刻印
치유治癒
비상飛上
자유
회상回想
담합談合
편지
고백
<2부>
꿈
아침
길
새벽 강가에서
세월의 강
밤의 노래
꿈길에서
그리움
행간行間에 머물다
궤적
퇴근
외출
<3부>
창동역 1번 출구
빛바랜 사진첩
탑골공원
노인요양원
중환자실
반창회
어느 중년의 일기
농담
<4부>
즐거운 리모델링
매너리즘 엿보기
자화상을 그리며
필연과 우연
반환점
평행선에서
나무와의 대화
어느 맑은 날에
<5부>
어머니
그리운 것은 아름답다
살아가는 동안
새들이 높이 나는 이유
하늘이 저토록 푸른 것은
그리운 사람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는가
너를 보내는 이유
이별의 화신化身
이별의 방식
이별은 만남의 그림자를 비켜간다
<6부>
가을 강가에서
가을비
가을바다에서
만추晩秋
서설瑞雪
나목裸木
겨울 역사驛舍에서
춘설春雪
꽃샘바람
바람이 전하지 않았을 뿐
4월의 바람
< 김부조 시인의 작품세계 >
변증법적 사유(辨證法的思惟)의 가능성
함홍근(咸弘根) / 지구문학작가회의 고문(前 울산 학성고, 중앙대부속고 교사)
시가 그려 내려는 세계가 지상이든 지하 동굴의 세계이든, 또 천상의 저 우주 어느 곳이든, 아니면 깊고 깊은 심해의 어느 바위 아래이든, 그것은 시작(詩作)하는 시인의 심장에서 발원하여 흔들리는 붓끝을 타고, 간장처럼 된장처럼 맛깔지게 우러나기도 하고, 젊은이들의 식성이나 생활습관에 걸맞게 햄버거나 탄산음료의 달콤함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쓰고자 하는 방향이나 방법에 따라 가장 진리처럼 간주될 수도 있고, 가장 모순된 갈등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적 전개가 자칫 자기도취적 현학적 자긍에 빠지기 쉬운 흠도 안고 있음직하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다.’나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라는 말과 같은 바, ‘밤은 아침이다’나 ‘캄캄하면 곧 밝음이 온다’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헤겔(Hegel) 철학의 변증법적 이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모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설을 얻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밤’이 ‘낮’이고, ‘어둠’이 ‘밝음’이며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라는 이원론적(二元論的) 우주관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람 人’이 곧 ‘하늘 天’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과도 일맥상통된 바 있다.
그러므로 시적 전개의 진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사유(思惟)의 징검다리를 걷고 있는 수많은 군중이며, 그들의 발끝에 채이는 작은 돌멩이 하나, 또는 그들의 다리 아래를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사나운 몸짓으로 흐르고 있는 물결이다. 때문에 위험은 상존한다. 징검다리가 감내해야 할 다리(橋) 위의 다리(脚), 그 웅성이는 아우성, 무게와 몸짓, 노도의 물결로 흙과 흙, 다리와 다리를 휩쓸어 갈 물줄기. 생존의 양면이다. 안전과 위험의 두 줄기 삶이다.
이처럼, 시의 이해나 해석도 독자나 평자에 따라 양면성이 상존한다. 노출된 양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적 안온함과 여유의 미소가 다리 아래를 흐르는 잔물처럼 기쁨이어야 한다. 때로는 슬픔이어야 한다. 만남과 이별이어야 한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부조의 시는 시편마다 변증법적 사유의 가능성을 깊이 안고 있다. 마치 삶의 네비게이션을 탑재한 원고지처럼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찾아 나설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만능적 종합적 수퍼 컴퓨터의 기능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고 있으나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수년 전까지, 쉽게 접하던 힘들고 한 서린 작품에서는 단어 하나, 행간 등 조심하려는 흔적이 많았었다. 연과 연, 망치와 징의 다듬는 소리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요즘의 시는 대담하고 줄기차다. 힘이 넘친다. 간혹 매끄럽지 못한 낯선 용어가 옥수수알처럼 섞여는 있으나, 산뜻하다. 반면 단조롭다. 지나치리만치 겁 없이 뛰어다니는 시인이다. 방안을 서성이다가 마루를 건너뛰고, 울타리를 넘기도 한다. 좁은 일터를 기웃거리다가 지하철을, 시장을, 도로를 달리기도 한다.
미안하다
너를 몰래 지운 것은
너의 묵인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내색하지 않은 것은
너의 허락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비껴 선 모습으로
이별의 방식을 엿듣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서두른 것은
나의 예감이
식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백>이다. <미안>한 마음과 그 <미안함>의 원인 결과를 명쾌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아픔이나 슬픔이든 간에 우리는 왜 <미안>한 지를, 그 마음의 세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안>은 곧 <독백>이다. <독백> 속에 감싸고 있는 <지운 것>, <내색하지 않은 것>, <서두른 것>은 <묵인>-<예감>, <허락>-<두려움>, <예감>-<식고 있음>으로 쇠사슬처럼(린케지적 상관관계) 서로 감싸고 질기게 이어져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묵인, 허락, 예감>과 <예감, 두려움, 식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첫 연에서의 <예감>과 끝연의 <예감>은 나의 <예감>인 동시에 묵시적 시각에 따라서는 나와 너의 각기 다른 <예감>으로 남을 수 있다.
<예감>은 <미안>을 키우고, 빠르게 성장한 커다란 <미안>은 다시 <예감>으로 남게 되는 <독백>의 산물이다.
이러한, 모순이 상반하면서도 모순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은 김시인의 작품 도처에서 눈에 들어온다.
바람은 울음을
녹일 수 없다
울음은
고통의 무게로 삭여야 한다
빗물은 눈물을
표절할 수 없다
눈물은
침묵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치유>
<없다>와 <한다>. 2행의 단정적 부정을 2행의 의지적 어미로 정당화하고 있다. 1연과 3연에서 <없다>의 극한상황에, 그 4연에서는 <한다>로 연을 끝맺음하는 형태의 답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시작 기교(詩作技巧)는, 우리들 삶에 상존하는 <독백>의 하루에서 말버릇처럼, 또는 행동하는 습관처럼 <치유>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또 <그리움>에 젖기도 하고, 습관화된 <독백>의 <너>로 인하여 <치유>되기도 하고 <나>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을 터득하면서 생의 언저리를 서성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한다. 무겁게 흐르는 <바람과 울음> <울음과 고통> <빗물과 눈물> <눈물과 침묵> 등 모든 <아픔>을 <운명>으로 치유하는 과정이 참된 정화(淨化, 카타르시스)의 모습이리라. 삶에의 의지적 자세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김시인의 시가 언제나 사랑의 노래나 일상의 탄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된다
둘은
넷을 그리워한다
산란을 비우면
투명함이 된다
투명함은
맑음을 그리워한다
거듭된
그리움의 산들에 부딪혀
메아리로 다가온
버림의 유혹
또다른
그리움의 시작이다
<그리움>이다. <그리움>은 소리 없는 <독백>이요, 강렬한 영상의 무선통신이다. <독백>을 치유하는 <아픔>을 알기에 김시인의 시가 존재한다. 시는 그의 하루이며 삶이며 인생이다. 또한 그의 일터는 시의 현장이요, 출퇴근길은 그의 시의 질긴 연과 행이며, 아내이며 가족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움>은 하나, 둘, 셋, 넷의 <그리움>이 각기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시작되는 과정을 <산란>이 <투명>으로 이어지지만 <메아리>로 다가오는 공허한 그리움일지라도 그것은 <또다른 / 그리움>이 시작되는 반복의 일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리라.
다만, 단조로울 수 있는 <한다> <된다>의 단점을 <버림> 때문에 또다른 <그리움>을 잉태하는 산실이 된다고 보면 어떨까.
눈물로 지는 꽃
가슴에 묻는다
애증에 지친 나무
홀로 서게 한다
사랑의 깊이보다
더 아파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