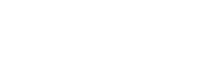천성현 동기(경상일보 태화루)의 글입니다.
고주택(08)
작성일
05-10-29 13:57 9,503회
0건
본문
[태화루]10월의 마지막 밤에
천 성 현 수필가 2005. 10. 29
"버려야 할 것이/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제 삶의 이유였던 것/제 몸의 전부였던 것/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 하면서/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는 도종환의 시단풍 드는 날이 한 구절쯤 떠오르는 계절이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이맘 때쯤이면 여인의 속옷 같은 단풍이 설악으로부터 내려와 신불산의 억새와 어우러지고, 내가 살고 있는 뒷산까지 시나브로 내려온다.
내일이 지나면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이 때쯤이면 라디오에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 졌어요"하는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아마 가을 낙엽을 이별로 연상하는 학습효과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별은 과거의 정리이자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체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기를 바란다. 과거란 이미 작아져서 입을 수 없는 옛날 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무심으로 살다가도 막상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왠지 추수가 끝난 들판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황량해져 온다. 갑자기 할 일 없이 마음만 분주해진다. 전화번호를 뒤져 이곳저곳에 안부전화도 하게 되고,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계절이 10월이다. 더구나 10월의 마지막 밤은 더욱 그러하다.
일년 중 내가 책상정리 하는 달도 10월이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달도 10월이다. 속절없이 사라져 버린 젊음이 그리워 한 잔하고, 이제 더 빠르게 쫓아올 세월이 두려워 또 마시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 날 같은 착각이 든다.
언젠가 남도를 여행하다 변산반도에서 수평선으로 떨어지는 낙조를 보았다. 그때, 마치 10월의 끝자락에 홀로 서있는 기분으로 명치끝이 저려오는 찡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왠지 그때 보았던 낙조를 연상케 된다.
유년시절 동해안의 일출은 지겹게 보고 자랐지만, 그날 본 낙조(落照)는 일출과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달랐다. 하루 종일 대지의 어두운 곳을 비추다 목숨을 다해 금방이라도 머리위로 추락할 것 같은 낙조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그날 처음 알았다.
해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의 또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다.
남도 속요정타령에 보면 지학(志學=10대)의 정은 번갯불 정이요, 이립(而立=30대)의 정은 장작불 정이며, 불혹(不惑=40대)의 정은 화롯불 정이요, 지명(知命=50대)의 정은 담뱃불 정이며, 이순(耳順=60대)의 정은 잿불 정이고, 종심(從心=70대)의 정은 반딧불 정이라 했다.
그렇다면 10월은 어디쯤에 속할까?
아마도 담뱃불과 잿불일 것이다. 담뱃불과 잿불은 가만히 두면 꺼지기 쉽다. 그렇지만 담뱃불은 빨면 다시 연기가 나고, 잿불은 전혀 불기가 없어 보이지만 뒤척이면 남아있는 불기로 된장 뚝배기쯤 능히 데울 수 있다.
10월을 악기에 비유하자면 해금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해금연주를 듣다보면 그 소리가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애절하게 쥐어짜다가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지 않으면서 또 슬그머니 살아난다.
10월은 또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들이 이 고개만 넘고 나면,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으로 믿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0월은 영허소식의 달이다.
가을 들판은 허옇게 비어가지만 집안의 창고는 채워진다. 창고를 곡식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창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우선이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오기 전에 내 안의 창고를 정리하고 비워야겠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 아닌가!
[이 게시물은 최고관…님에 의해 2012-06-13 21:15:07 동문소식에서 이동 됨]
천 성 현 수필가 2005. 10. 29
"버려야 할 것이/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제 삶의 이유였던 것/제 몸의 전부였던 것/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 하면서/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는 도종환의 시단풍 드는 날이 한 구절쯤 떠오르는 계절이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이맘 때쯤이면 여인의 속옷 같은 단풍이 설악으로부터 내려와 신불산의 억새와 어우러지고, 내가 살고 있는 뒷산까지 시나브로 내려온다.
내일이 지나면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이 때쯤이면 라디오에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 졌어요"하는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아마 가을 낙엽을 이별로 연상하는 학습효과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별은 과거의 정리이자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체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기를 바란다. 과거란 이미 작아져서 입을 수 없는 옛날 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무심으로 살다가도 막상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왠지 추수가 끝난 들판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황량해져 온다. 갑자기 할 일 없이 마음만 분주해진다. 전화번호를 뒤져 이곳저곳에 안부전화도 하게 되고,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계절이 10월이다. 더구나 10월의 마지막 밤은 더욱 그러하다.
일년 중 내가 책상정리 하는 달도 10월이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달도 10월이다. 속절없이 사라져 버린 젊음이 그리워 한 잔하고, 이제 더 빠르게 쫓아올 세월이 두려워 또 마시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 날 같은 착각이 든다.
언젠가 남도를 여행하다 변산반도에서 수평선으로 떨어지는 낙조를 보았다. 그때, 마치 10월의 끝자락에 홀로 서있는 기분으로 명치끝이 저려오는 찡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10월의 마지막 밤은 왠지 그때 보았던 낙조를 연상케 된다.
유년시절 동해안의 일출은 지겹게 보고 자랐지만, 그날 본 낙조(落照)는 일출과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달랐다. 하루 종일 대지의 어두운 곳을 비추다 목숨을 다해 금방이라도 머리위로 추락할 것 같은 낙조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그날 처음 알았다.
해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의 또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다.
남도 속요정타령에 보면 지학(志學=10대)의 정은 번갯불 정이요, 이립(而立=30대)의 정은 장작불 정이며, 불혹(不惑=40대)의 정은 화롯불 정이요, 지명(知命=50대)의 정은 담뱃불 정이며, 이순(耳順=60대)의 정은 잿불 정이고, 종심(從心=70대)의 정은 반딧불 정이라 했다.
그렇다면 10월은 어디쯤에 속할까?
아마도 담뱃불과 잿불일 것이다. 담뱃불과 잿불은 가만히 두면 꺼지기 쉽다. 그렇지만 담뱃불은 빨면 다시 연기가 나고, 잿불은 전혀 불기가 없어 보이지만 뒤척이면 남아있는 불기로 된장 뚝배기쯤 능히 데울 수 있다.
10월을 악기에 비유하자면 해금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해금연주를 듣다보면 그 소리가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 애절하게 쥐어짜다가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지 않으면서 또 슬그머니 살아난다.
10월은 또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들이 이 고개만 넘고 나면,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으로 믿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0월은 영허소식의 달이다.
가을 들판은 허옇게 비어가지만 집안의 창고는 채워진다. 창고를 곡식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창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우선이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오기 전에 내 안의 창고를 정리하고 비워야겠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 아닌가!
[이 게시물은 최고관…님에 의해 2012-06-13 21:15:07 동문소식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